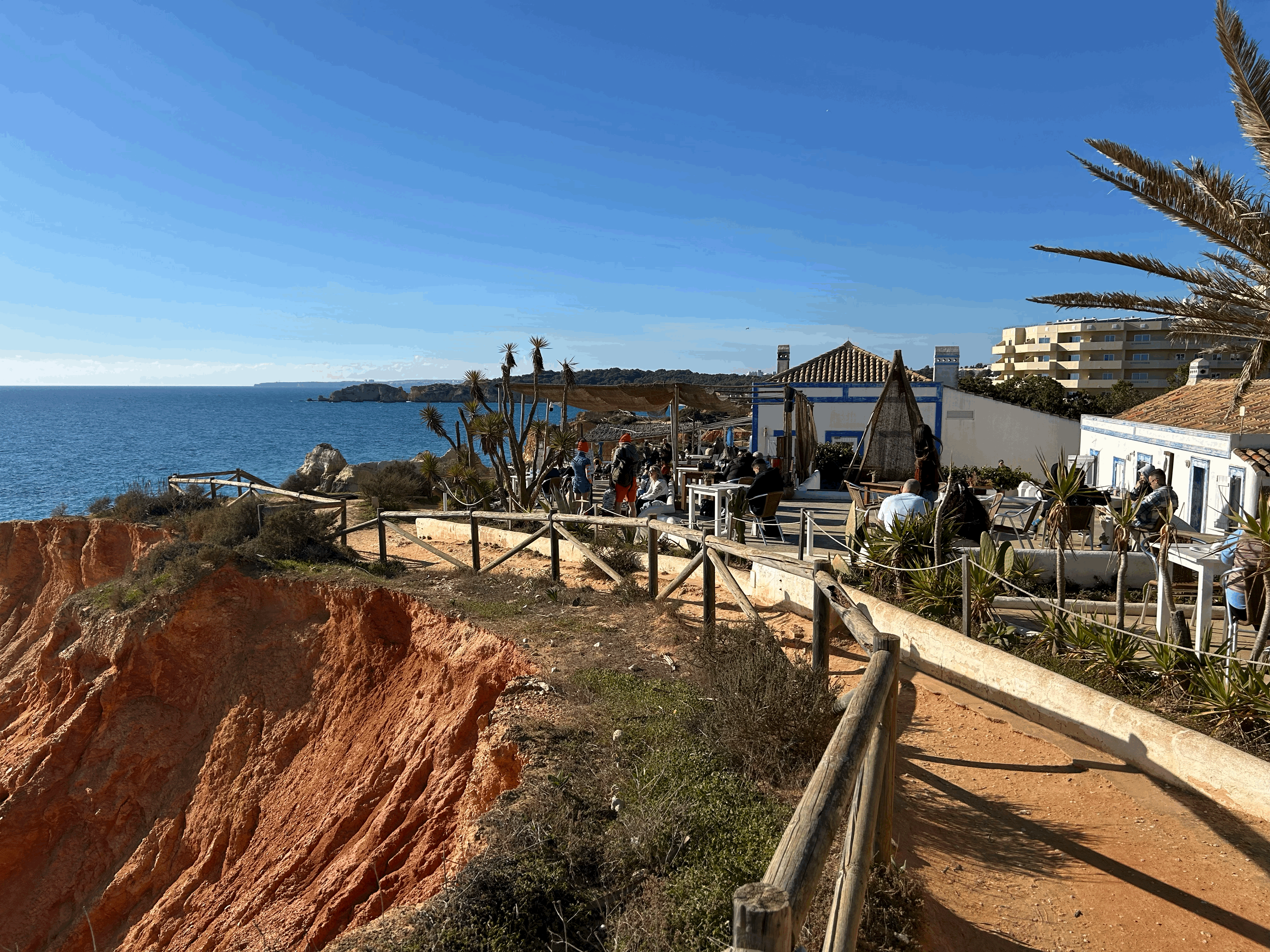아름다운 길을 두번째 걷는 느낌은 어떨까?
사람은 간사해서 금방 지루해 하지는 않을까?
맞다.
그렇지만, 겨우 두번째 걸으면서 시큰둥해질수는 없다.
좁은 대서양은 넓은 모래벌판 때문이었고,
높은 눈높이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니 좁아 보이지 않는다.
어제 바닷가에서 확인하지 못한 코끼리 바위를 보러갔다.
예쁘고 귀여웠다.
바다도 예뻤다.
멋진 해안을 뒤로 하고 항구로 간다.
어제와 다르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지?
아하, 1월 1일 휴일이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문을 닫았던 식당들이
깨끗한 식탁보를 펼쳐놓고,
우리를 유혹한다.
아니야, 우리는 아침 잘 먹고 나왔어.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해물밥을 먹으러 갈거야.
긴 산책길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다들 편안한 동네사람들,
걱정거리를 뒤에 묻어둔 여행객들이어서 그렇다.
어제까지 한국사람이라고 자랑스레 떠들었는데,
제주항공의 참사가 벌어지고 나니
사기가 떨어졌다.
조용하게 다니자.
포르티망의 사람들이 즐겨찾는 식당에 왔다.
와, 시끌벅적한다.
빵을 주문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예전같으면 주눅이 들어서 일단 오케이를 했을텐데,
일단 물었다.
그거 식사에 포함되요?
아니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럼 됐어요.
우리는 해물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와인메뉴 갖다 주세요.
여기 있어요.
오, 하우스 와인 맑은 것으로 1리터 주세요.
알겠어요.
너무 시끄러웠지만, 새해는 그렇게 맞이해도 좋았다.
그렇지 않은가?
하우스 와인은 살짝 가볍다.
그리미도 무려 세잔을 마실수 있을 정도다.
아, 그런데 해물밥 2인분을 달라고 했더니
무려 4인분을 가져다 준다.
먹어도 먹어도 새우와 밥은 끝나지를 않는다.
아니, 이럴거면 가격을 좀 낮추고 양을 줄이면 안돼요.
차마 말하지 못했다.
흠.
해물밥은 된장국 맛이 살짝 난다. 괜찮다.
맛의 원인을 따라가보니 결국 고수였다.
야, 고수가 이런 맛이 나는구나.
미처 몰랐다.
바지락, 털게, 새우 2종류, 홍합, 작은 바닷가재가 잘 어우러진 맛이다.
계획은 이것을 다 먹고 연어구이까지 먹으려고 했는데,
먹어도 먹어도 끝이 나지 않는다.
와인도 마셔도 마셔도 끝나지 않는다.
44유로 + 11유로 = 55유로(83,000원)
이 정도의 음식을 우리 둘이 전부 소화하기는 힘들다.
중간에 껍질이 가득한 접시를 비워준다.
그 손길이 조금 다정해야 하는데, 거칠다.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는다.
흠, 그랬구나.
거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와서
끝났냐고 묻는다.
그 손길이 너무 빨라서 아니라고 제지하지 못했다.
그리고는 두잔의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다.
강렬하다.
잘 먹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삼겹살을 사려고 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고 구글지도가 말한다. 고마워.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 저 별은.
저 달은.
별과 달과 지는 노을이 너무 아름답다.
스페인 가지말고 여기에 며칠 더 있을까?
별과 달을 구경하다가 흥에 겨워 전화기를 의자에 두고왔다.
어떻게 하지?
달려갔다.
누군가 우리 자리에 앉아있다.
우리가 다가가자 그가 반갑게 맞이한다.
아, 너무 고마웠다.
그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친구다.
너무 고마워, 저 발게 빛나는 별이 샛별이야.
이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르키며 물었다.
혹시 저 별의 이름을 아느냐고.
모르겠단다.
샛별이에요.
그런가요, 정말 사랑스럽군요.
네, 그래서 샛별이에요.
욕조에 물을 받아서 새해 첫날을 되새김질했다.
2025년이다.
나는 흘러간 물이 되었고,
새로운 물들이 역사의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좋다.
3일에 파루로 이동해서 1박을 하고, 차를 빌려 스페인으로 넘어간다. 탕헤르로 넘어가는 지브롤터해협을 보고 싶지만 조금 멀다. 많이 고민했지만, 말라가와 세비야를 가는 것으로 했다. 일정에 여유가 생긴다. 만일 지브롤터의 숙소가 처음 검색했을 때처럼 43유로였다면 무리해서라도 갔을텐데, 그 사이에 20유로가 올랐다. 그래, 포기하자. 너무 먼 거리를 운전하는 것도 힘들다.
먼저 말라가에서 4박을 하고 론다를 다녀오고, 세비야로 이동해서 3박을 한 다음에 파루로 돌아가서 차를 반납한 다음에 리스본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일정으로 마무리하자. 아, 여행이 끝나가는구나.